
여름을 좋아한다.
특히 여름의 찬란함을 좋아한다.
눈이 부실 정도의 햇빛이나 바다에 비치는 윤슬처럼
그런 반짝임들을 사랑하는데,
반짝임들을 보고있자면 왠지 모르게 과거를 바라보는 느낌이 든다.
기쁨과 슬픔의 공존.
남들은 찬란함이라는 단어를 어떤 것으로 정의할지 모르지만
내게 찬란함이란 그런 모순적인 반짝임이었다.
그리고 그런 반짝임이 이 책에 담겨있었다.

나의 생일은 유월이지만, 시월에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월과 시월이 함께 담긴 책이고
아끼는 사람이 준 책이라 한자한자 마음을 담아 읽었다.
제목과 첫페이지를 읽고 내 생각이 나서 샀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소중히 읽지 않을 수 있을까.
ㅎㅎ 잘읽었오💛
<밝은 밤>
나는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걸 참 좋아한다.
‘나는 희령을 여름 냄새로 기억한다’
그리고 첫페이지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이
좋아하는 표현들로 묘사되고 있었다.

문학 작품이든 방송이든 어디든 대체적으로 부모 자식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표현한다.
자식은 가장 힘들 때 유일한 편인 부모에게 기대고,
부모는 자식에게 누구보다 공감과 위로를 주는
그런 당연하고 아름다우며 유일무이한 사랑.
그러나 현실엔 다른 사랑과 사람이 더 많다.
자신의 힘듦을 부모에게 들키는 것이 가장 싫은 사람.
그리고 그 이유가
부모의 걱정이 아닌 본인의 자존심 때문인 사람도 있다.
부모 역시 자녀의 아픔을 무조건적으로 공감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가깝기에 더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랑도 있다.
이 소설에서는 그런 관계에 아픔들까지 잘 표현했다.
너무 잘 표현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아프기도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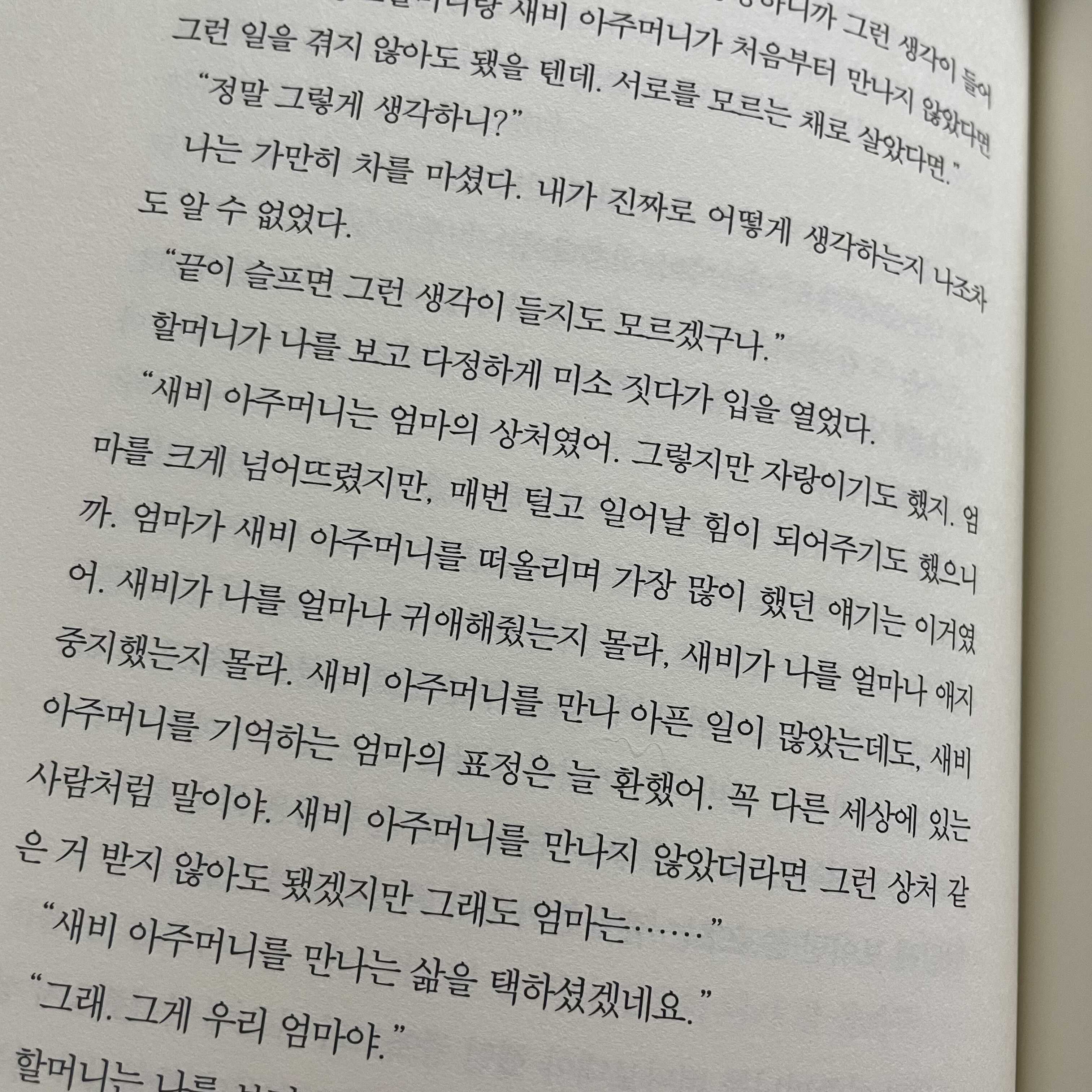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상처 같은 거 받지 않아도 됐겠지만
그래도 만나는 삶을 택했어’
두 여자의 우정이 보이는 대목이다.
단순히 우정 뿐 아니라 인간 관계 어느 곳에도 적용해서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다.
요즘은 모든게 간편하고 쉽다.
우정이나 사랑이나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놓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외친다.
나의 팔과 다리가 떨어져나가 평생이 불편해지는,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 관계는 나를 위해 끊어 내는게 맞다.
그러나 내 삶에는 그런 고통보다
종이에 베어 피가 흐르는 경우가 더 여러 번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은 생채기는 아무는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진다.

내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까봐,
그 상처로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봐.
그래서 아예 마음을 닫은 채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
애틋하고 아프지만 닫혀있는 그런 관계.
가깝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등잔 밑 그림자 같은 관계.
이 소설 속에는 아픈 관계가 많다.
그러나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사랑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인지도 알게 된다.
읽다보면 아픔 마저 소중해질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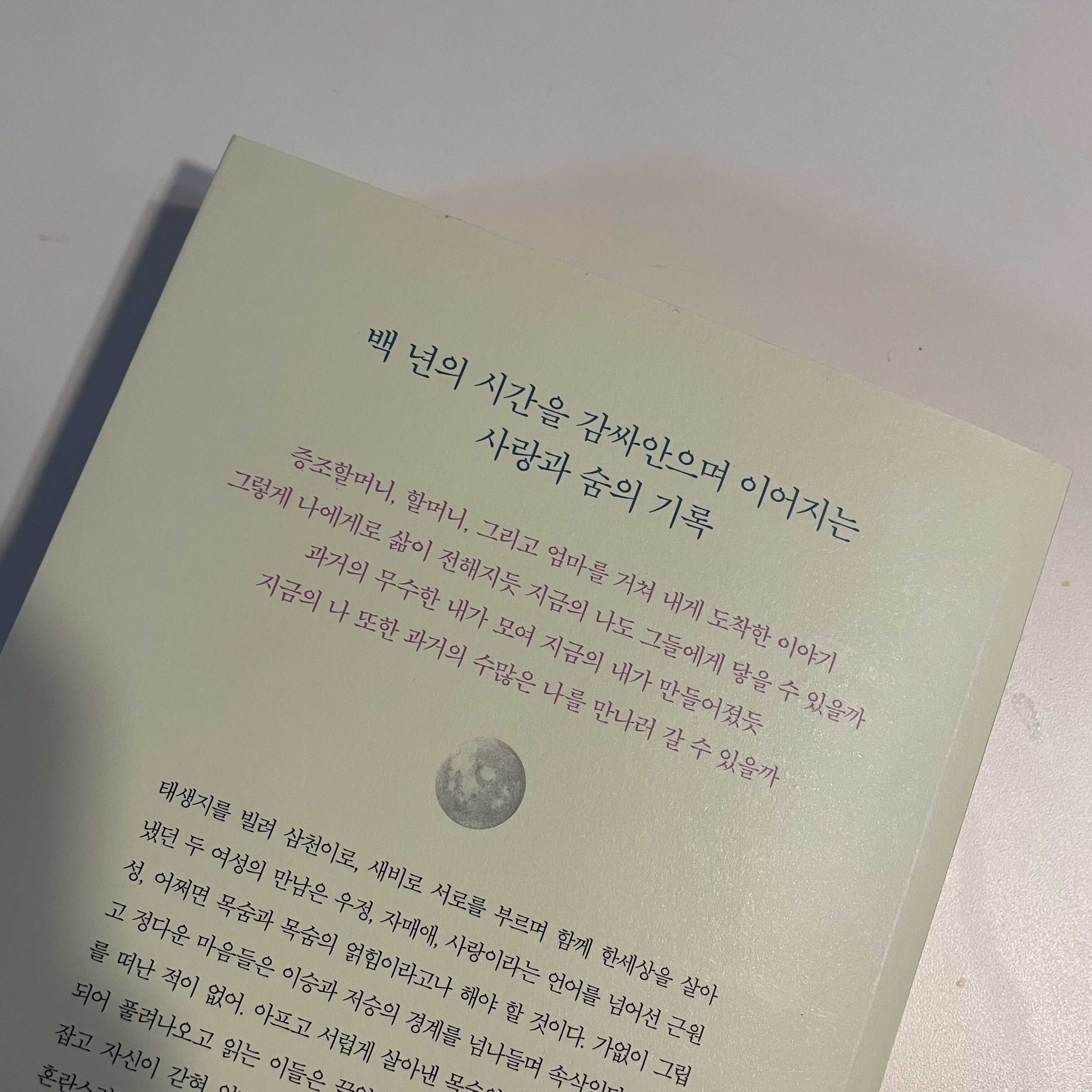
최종적으로, 여자들의 이야기다.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손녀딸인 나까지.
세대를 거쳐 여자들이 겪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사람은 늘 사람 때문에 아프고 결국 사람에게 위로 받는다.
남자들이 너무 나쁘게 묘사되어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함.
(새비 아저씨의 존재가 그나마 따수웠다.)
그 시절 서술은 수긍이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몰입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한다.
아주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잔잔하게 흘러가고
바다의 깊이처럼 깊은 이야기지만 깊음에 공허해지기도 하는.
모래사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개가 있고
그 조개가 발바닥을 콕콕 찌르듯
내 마음을 콕콕 찔러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주운 조개가 마냥 못나지만은 않아서 집으로 들고 오게 되는
그런 소설.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완전한 행복ㅣ정유정 작가ㅣ은행나무 출판사 (2) | 2021.10.28 |
|---|---|
| 구의 증명ㅣ최진영 작가ㅣ은행나무 출판사 (8) | 2021.10.27 |


댓글